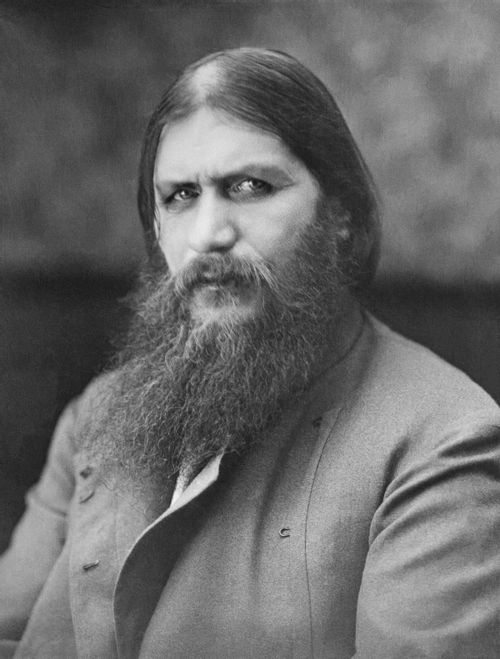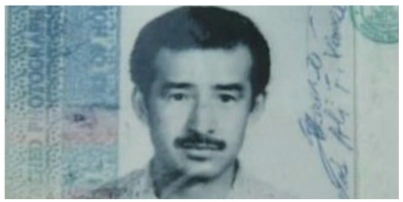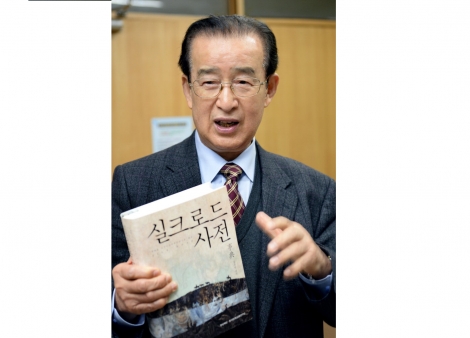이해와 오해 [56] 우리 술
수정 : 0000-00-00 00:00:00
애석하게도 우리에게는 위스키나 마오타이처럼 나라를 대표할만한 술이 없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이 사실상의 식민지가 된 후 1909년에 제정된 주세법과 한일 합방 후 1916년에 제정된 주세령으로 술은 양조허가를 받은 사람만 빚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정책은 지금까지도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획일화된 술만 남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각종 문헌은 200가지를 넘는 술의 이름과 제조법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져버렸다.
조선시대의 술은 만드는 방식에 따라 대개 탁주(濁酒), 청주(淸州), 소주(燒酒) 세 가지로 나뉜다. 탁주는 글자의 뜻 그대로 뿌연 술이며 “마구 걸러냈다”하여 막걸리라 부른다.
고두밥을 쪄서 식힌 후 누룩을 섞고 따뜻한 물을 부어 발효시킨 것이 술밑(酒母)이고, 술밑에다 물을 붓고 체로 걸러낸 것이 탁주이다.
청주는 탁주와 같은 방법으로 만드나 거를 때에 용수를 술독에 넣고 용수 속에 고인 맑은 술을 떠낸 것이다.

우리 고장 파주가 배출한 뛰어난 박물학자 서유구(徐有榘, 1764~1845)선생의 저서 《임원경제지》에는 약현(藥峴, 지금의 서울 중림동)에 살았던 약봉(藥峰) 서성(徐省)의 모친인 고성 이씨가 이 술(청주)을 잘 만든다 하여 약주(藥酒)라 부른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주는 삼해주(三亥酒)였다. 한강변에서 삼해주를 빚느라 막대한 양의 쌀이 낭비된다하여 18세기 이후로는 삼해주 제조 금지령이 자주 거론되었다.
소주는 “불태운 술”이다. 솥에 술밑을 채우고 그 위에 증류기(소주고리)를 연결한다.
솥 밑에서 불을 때면 휘발한 알콜 성분이 증류기를 통과하면서 이슬처럼 맺혀서 내려오는데 이것을 받아낸 것이 소주다.
그래서 소주를 일명 노주(露酒, 이슬 술)이라 부른다.
오늘날 우리가 익히 듣고 있는 “진로(眞露)”란 상표가 여기서 비롯되었다.
소주의 제조기법은 화학이 발달했던 아라비아에서 시발했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중국 문헌에서는 소주를 아라길(阿喇吉), 아리걸(阿里乞)라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소주를 내릴 때 나는 냄새를 아라기 냄새라 하고 개성에서는 소주를 아락주라 하였는데 모두가 소주란 뜻의 아랍어 ‘아락(araq)’에서 유래한 말이다.
소주는 고려 후기에 원나라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소주 산지로 이름난 개성, 안동, 제주도 등이 모두 원나라의 일본 정벌과 관련된 지역임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소주는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된 알콜에다 물을 부어 희석시키고 그기다가 각종 향료를 넣어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값이 싸 서민이 즐기는 술이지만 조선 시대에는 소주는 상류층이라야 마실 수 있는 고급주였다.
《태조실록》에는 이성계의 맏아들 방우(芳雨)가 소주를 너무 마셔 병이나 죽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수광(李晬光)이 지은 《지봉유설》(1614년)에는 소주는 비싸고 독해서 작은 잔에 따라 마시므로 작은 술잔을 소주잔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사를르 달레(Charles Dallet)가 편찬한 《조선 교회사》(1874년)는 양반들은 여름에 꿀물과 소주를 많이 마신다고 기록하였다.
여름에도 시어지지 않는 술은 소주이기 때문이다.
율곡 이이는 여름철 제사에서는 청주는 맛이 쉬 변하니 소주를 쓰라고 권고하는 글을 남겼다.

글 박종일(지혜의 숲 권독사)
#57호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