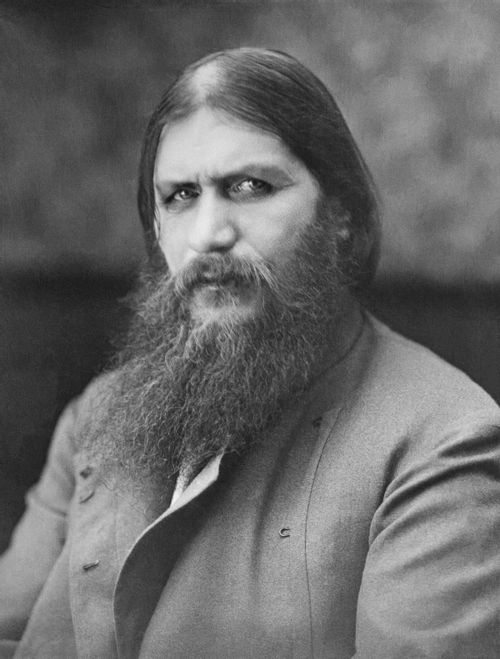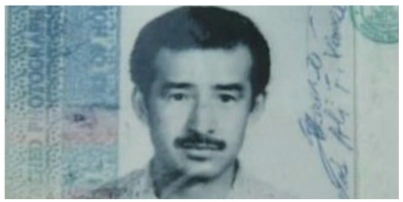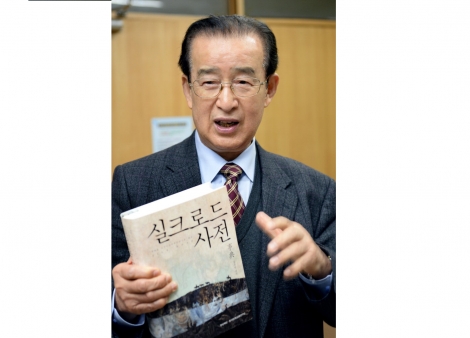이해와 오해 [55] 광화문 단상
수정 : 0000-00-00 00:00:00
광화문 단상
반갑지 않은 겨울비가 약간 흩뿌리든 어느 토요일 오후에 나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려고 경의선 열차를 탔다.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독신 생활을 하는 아들에게 주말에 집에 들르겠냐고 전화로 물었더니 광화문 시위에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그것이 나의 서울행을 유인했다.
30여 년 전인 1987년 6월 어느 날 땡볕아래서 나는 서울 시청 앞 광장에 서 있었다. 그 때 (대통령 직선과 학우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에 이른바 ‘넥타이부대’가 동참하기 시작하자 정국은 급전했고 곡절을 거친 끝에 마침내 제6공화국이 출생했다. 나는 그 넥타이부대의 한 사람이었다. 시위에 참가한 나의 바람은 간단명료했다-내 자식들에게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고 싶다.
그런데 30여년이 지나 그 때의 내 나이에 다다른 내 아들이 광화문 시위에 참가하여 묻고 있다, “이게 나라냐?”고. 광화문에 도착한 나는 거대한 사람의 물결 속에서 참담함을 느꼈다. 30여 년이 지났는데 어찌하여 이건 나라도 아니라는 지경으로 되돌아갔단 말인가....한편으로 나는 거대한 무리가 내뿜는 숨결 속에서 강렬한 희망의 기운을 느꼈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와 더불어 그 못지않게 강력하면서도 다양한 욕구를 표현하는 구호가 넘쳐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소리치며 묻고 있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이냐! 그리고 광화문에는 30여 년 전과는 달리 (넥타이부대와 학생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 모든 직업군이 골고루 나와 있었다. 그것도 100만 명이 넘는....
나는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다. 아버지 대통령은 5.16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이른바 ‘혁명공약’이란 걸 발표했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이랬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군인)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물론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버지 대통령은 3선 개헌을 하면서 이렇게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대통령하겠다. 이후로는 국민 여러분에게 표 달라고 구걸하지 않겠다.” 그는 이 약속은 완벽하게 지켰다. 유신쿠테타를 일으켜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
아버지 대통령은 유신체제를 일컬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아니라’ ‘역사에 맡기겠다’고 했다. 식언과 궤변은 전승되는 유전자인 것 같다.
역사는 국민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평가가 역사의 평가이다. 지금 우리는 광화문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 나의 평생을 규정해온 박정희 시대, 그 야만의 시대가 이제 겨우 저물려하는 모양이다.

글 박종일(지혜의 숲 권독사)
#54호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