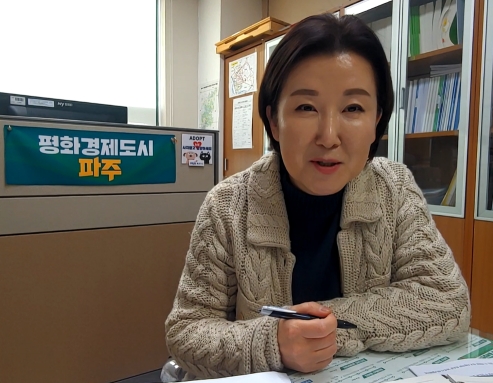파주의 아름다운 얼굴 (72) 이산, 슬픔에게 기대어 산 세월 70년 주경식씨
수정 : 0000-00-00 00:00:00

이산, 슬픔에게 기대어 산 세월 70년
이산가족離散家族- 가족의 구성원이 본의 아니게 흩어짐으로써 서로 만날 수 없게 된 가족.
이산가족의 사전적 해설이다. 이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정은 그 이유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이거나, 유추해 볼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 말고, 찾지 못해 애태우며 살아가는 또 다른 여러 경우의 가족들. 그러나 여기 生死조차 확인할 길 없이 역사가, 이념이 부모와 자식을 형제와 자매를 갈라놓은 체 70년 침묵으로 피 끓는 그리움을 눌러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산, 슬픔에 기대어 70년 세월을 살아 온, 이제 80세를 바라보는 연다산동의 주경식씨가 바로 그이다.
주경식씨의 고향은 황해북도 개풍군 봉동면이라고 한다. 황해북도라고 하면 낯선 행정구역명으로 인해 이 곳 파주에서 먼 거리로 여겨질 수 있으나, 실상 봉동면의 위치는 경기도 서북에 위치한 군으로 동쪽으로는 장단군과 경계를 접하고 있고 남쪽은 임진강, 한강을 경계로 김포시 파주시와도 근접한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고 한다.
지금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도라전망대에 오르면 주경식씨가 나고 자란 마을이 그 모습을 간직한 채 손에 잡힐 듯, 보인다고 하며 대성동 마을까지 만이라도 더 가까이 가면 살던 집도 보일 것만 같다며 그 아쉬움을 한숨으로 내뱉고 있었다.
한두 달 뒤에 돌아오겠다던, 지키지 못한 약속
나고 자란 집이, 동네에 이르는 고샅길이, 그 산하를 한 번 본다는 일이 무어 그리 간절할까, 사실 그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현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어려움이 있었다.
고향이라는 것에 대한 정취를 오래 전 잃고 살아가는 세상.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단 번에 닿을 수 있는 일일생활권으로 세상이 묶인 지가 오래이므로 말이다.
그러나 주경식씨의 이 그리움에는 지키지 못했던 약속으로 인한 미안함 있었다.
“1.4후퇴로 수많은 중공군이 몰려 내려온다는 소문이 먼저 돌았어. 아직 어린 두 동생과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와 형님 그리고 나, 이렇게 세 남자만 임진강을 건넜지. 피난할 장소를 알아보고 데리러 가기로 했어. 길어야 한두 달일 거라며 아직 어리니 나는 남으라던 어머니의 손을 내가 뿌리치고 따라 나서서는 70년이야 70년......”
그러나 임진강을 건넌 뒤 바로 지금의 통일대교 자리의 교각이 폭파되었다고 한다.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다고, 당연히 다시 돌아가 식구들을 데리고 내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졌었다고도 했다. 그러다 언제인가부터 그 믿음이 체념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얼굴이 흐릿해진 후부터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게 되었다고. 겨우 열 살 무렵이었으니 많은 기억이 남았을 리 만무한데도 불구, 주경식씨가 전하는 봉동면이라는 낯선 동네의 전경은 구체적이고 적나라했다.
“집 앞에는 기찻길이 있었지. 기차가 오고 가는 소리를 들으며 잠든 기억이 나. 동생이 둘이었는데 제일 막내는 두어 살이었을 거야. 막내를 업은 어머니가 집 앞 기찻길 건너 작은 개울에서 빨래를 하셨고, 나는 친구 녀석들하고 그 어귀에서 고기도 잡고 멱도 감고 그랬거든.” 아마도 도라산역에서 장단역으로 이어져 있었을 경의선이 지나는 어디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그 시내는 사내천이라는 봉동면에 위치한 작은 하천이었을 것이다.
지금도 통일로에서 개성공단으로 이어진 도로를 탄다면 주경식씨가 사는 연다산동에서도 30분 안쪽이면 도착할 수 있을 거리. 그러나 그는 갈 수 없다.

그래서 더 떠날 수 없던 파주,
“차라리 멀리 떠나 살까도 했었어,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말이야. 이북에 두고 온 어머니랑 어린 것들 생각에 술만 드시는 아버지를 보면서는 말이야. 그렇게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하고 안 해본 고생 없이 고생 많이 했어. 해마다 명절 때만 되면 둘이서 많이도 울었지. 그렇게 의지하고 살던 형님 떠난 지도 이제 20년이야. 그래도 여기를 떠날 생각은 못하겠어. 좋은 세상 오면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잖아. 여기 파주에 있으면 말이야”
그랬다. 나고 자란 곳이 파주인 사람들이거나 그저 생업이 파주에 있어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들의 정착과는 다른 차원의 머묾이었다.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 곳으로 빨리 닿기 위해 잠시 머물려던 걸음으로 연다산동 한 자리를 맴돌 듯 산 시간. 70년.
단지 그 이유 뿐만은 아니었다고도 했다. 임진강 건너 불어오는 바람이라도 맞으면 두고 온 식구들 잘 지내겠지.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고 기도도 건네곤 했다는 주경식씨.
무슨무슨 때마다 식구들 모여 앉는 친구들 동네 사람들 보면 훌쩍 임진각이든 통일동산이든
다니러 가기도 좋았다고. 도라산역이 생기면서는 가끔씩 여기 다녀가신다고 했다. “도라산역 기찻길을 가로질러 쪽 앞으로만 걸으면 금방이라도 집이 나올 거 같거든. 그래도 여기서 파주 사람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나마 이렇게라도......”
지인의 도움으로 동행해 들어간 도라산역 앞에서 철조망 너머 북녘 땅 바라보시는 눈빛이 흐려지고 있었다.
그랬다. 종전하지 못한 이 나라 분단의 역사 속 그저 최북단의 도시로만 여겨지던 파주는 이미 그 위치적 입지만으로도 이산가족의 슬픔을 끌어안고 어쩌면 저들의 눈물까지를 함께 흘리고 있는 도시였다.

더 이상의 ‘鬼鄕’은 없어야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끝난 뒤, 오는 봄 따라 들려 온 남북 정상회담 소식.
“이 번에는 다를 거야, 그치? 김정은이가 미국하고도 만난다고 했다잖아? 내 나이 80인데 잘 버텼지? 허허.” 수화기 너머 너스레까지 치시는 주경식씨의 목소리는 사뭇 들 뜬 듯 경쾌하셨다. 건 15년 당뇨를 앓고 있는 탓에 합병증이 올까 늘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의 마지막 소망은 오직 한 가지라고 하셨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머님이야 돌아가셨겠지? 동생들 말이야. 나보다 어리니 살았을 지도 모르잖아. 어머님은 어찌 돌아가셨는지, 얼마나 고생하셨을 지. 여기야 남자 셋 내려온 거니 북한에서 그 어린 것들 데리고 하셨을 고생에야 대하겠어? 그 무덤에 절이라도 한 번
올리고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1983년 이산가족 찾기 그 때만 해도 40대였던 주경식씨는 그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다. 돌아가신 형님과 방송국 찬 바닥에서 한 달을 넘게 살다시피 머물렀었다고. 그러나 찾을 수 없던 가족, 혹시나 하던 기대를 접어야 했던 날. 그리고 이어지던 오랜 그리움의 후유증. 잊을 만도 하지 않는 세월이지 않느냐 누가 묻는다면 못 견딜 거야 없지, 라고도 했다. 그러나 ‘만날 수 있을 거다’ ‘찾을 수 있을 거다’ 세상이 주는 기대 속에서 간절했던 것들이 갖는 힘은 큰 것이었던 모양이었다. 남북관계가 조금만 좋아지는 것 같으면 들떠서 잠이 안 왔다고. 어느 날 부터는 그 기대치도 작아졌지만 이 번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또 다른 거라고. 당신의 나이가 이젠 80이라고.
“죽으면 제일 먼저 봉동 내 고향 가 보려고, 허허허.” 주경식씨의 마지막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귓가를 맴돌았다. 작년 개봉하여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적신 영화 ‘귀향’ 여기서의 귀향이 歸鄕이 아닌 ‘鬼鄕’이라는 의미로 더더욱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영화.
죽어서야 고향에 돌아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
지금 우리의 역사가 바라보고 가고 있는 곳의 이정표는 어디인가 생각해 본다.
주경식씨와 같은 이산가족들에게 다른 자리에서 흩어져 살게 만든 책임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자유로워선 안 된다. 이념의 문제였다고만 밀어 두어서도 물러앉아서도 안 된다.
이젠 더 이상 저들이 역사를 기다려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더 이상 이 서글픈 ‘鬼鄕’은 막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라산역을 나와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길, 빈집에 들기 싫으시다 며 마을 사람들이 있는 마을회관에 내려 달라시던 뒷모습이 무겁게 남았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