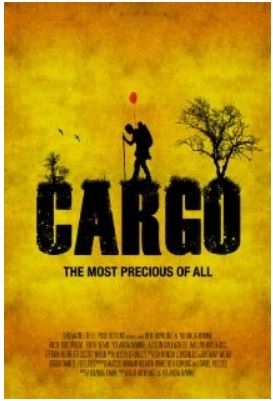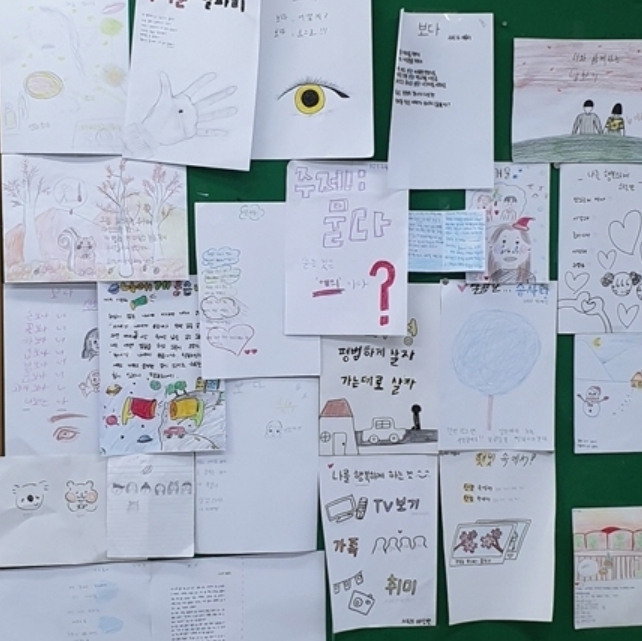흔한 고딩의 같잖은 문화리뷰<29> - “내가 아는 몸”
수정 : 2018-09-26 14:00:16
흔한 고딩의 같잖은 문화리뷰 <29>
“내가 아는 몸”
따끈하고 부드러운
조은
도어락을 다 누르기도 전에 문 너머에서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린다. 애옹~ 나무가 우는 소리다(나무는 우리집 고양이 이름이다). 문을 열면 다리에 머리를 문대며 하얀 털을 묻히고, 복도에 놓인 스크래쳐를 긁는다. 발톱을 스크래쳐에 걸고 기지개를 킬 땐 경이로울 정도로 허리를 휠 수도 있다. 가방을 내려놓고 그런 나무를 구경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처음 우리 집에 올 때 나무는 갑티슈만 했다. 얼굴은 주먹보다 작아서는 그 얼굴의 반을 초록색 눈이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 낯선 생명체가 너무 귀엽고 무서워서 손도 뻗지 못하고 뚫어져라 쳐다만 봤다. 만지면 바스라질 것 같은 성근 털도 나를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나무도 내가 낯설었는지 어두운 곳에서 그 큰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다 잠이 들었다. 나는 그날 밤 잠도 안 자고 그 어린 몸을 관찰했다.
나무가 집안을 마구 활보하고 다닐 무렵, 집 가구는 남아나지 않았다. 나무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발톱은 늘 어딘가에 걸리고 무언가를 할퀴고 지나갔다. 내 허벅지에 올라오려다 다리에 상처를 낸 적도 많았다. 날카로운 발톱과 달리 발바닥은 연했다. 단단한 듯 말랑하고 푹신한 발바닥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났다. 나무가 누워있는 나를 밟고 지나갈 때면 그 작은 발바닥은 나무의 무게를 한데 모아 나를 공격했다.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요즘은 나무의 발에 밟히면 나도 모르게 한 대 맞은 소리가 나온다. 윽! 하는 소리가 들리면 어디선가 나무가 가족의 몸을 밟고 있다는 거다. 바꾼 고양이 모래가 맞지 않아 나무는 방광염에 걸렸고, 방광 건강을 챙기자며 바꾼 사료는 나무를 무겁게 만들었다. 이제는 내 배나 허벅지 위에 올라가는 게 불편할 정도의 부피를 가지기도 했다. 새로 찾은 내 곁은 바로 겨드랑이 사이인데, 침대에 누우면 나무가 올라와 겨드랑이 밑에 얼굴을 처박는다. 따끈따끈한 나무의 몸은 금세 조용하게 들썩거리고, 나는 나무가 고롱거리는 소리를 멈추지 않도록 귀 사이, 목 뒤, 등허리 등을 쓰다듬는다. 나무의 몸은 무척 부드러워서, 쓰다듬는 나도 기분이 나른해진다.
아침에 일어나 나무를 두고 현관으로 가면 나무는 잠깐 고개만 비추고 다시 잠을 자러 간다. 가지 말라 보채거나 다정하게 배웅해주지는 않지만 나무는 분명 잠에서 깨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내가 나무를 보고 싶어 하는 만큼만 나무가 나를 보고 싶어 하면 좋겠다. 나무가 나만큼 바빠서, 하루 종일 나를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나무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내가 없는 시간이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난 집에 가 나무를 겨드랑이 틈에 두고 그 따끈하고 부드러운 몸을 쓰다듬으며 내가 없는 나무의 하루를 궁금해 하며 또 미안해할 거다. 그리고 다시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을 거라고 또 다짐할 거다.
조은 (파주에서 Teen 기자)

#91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