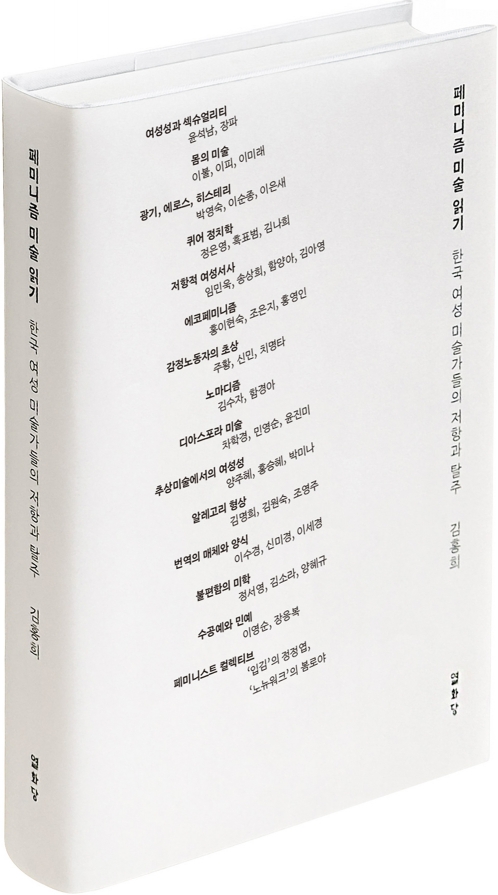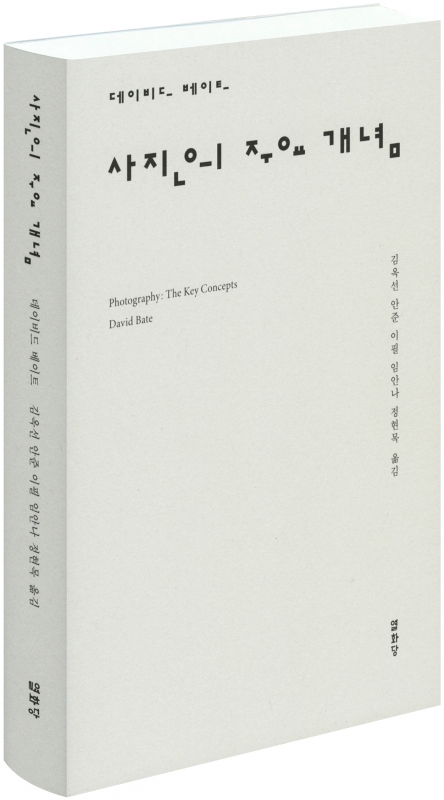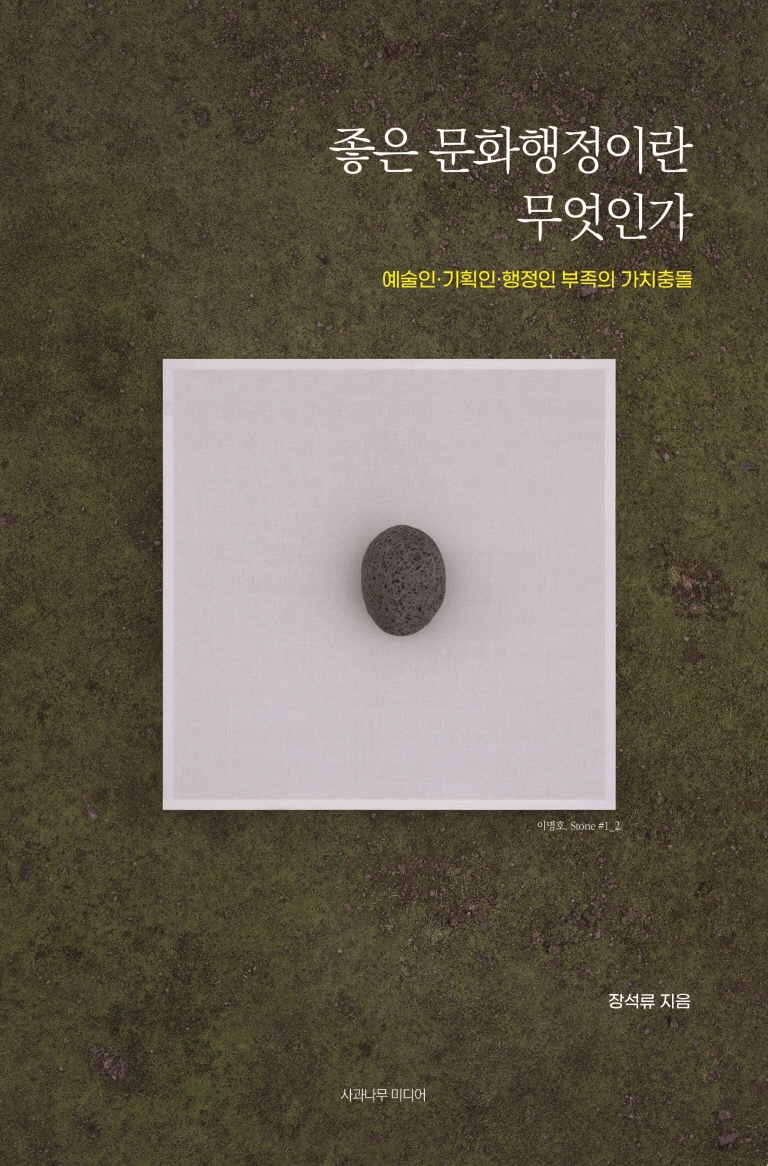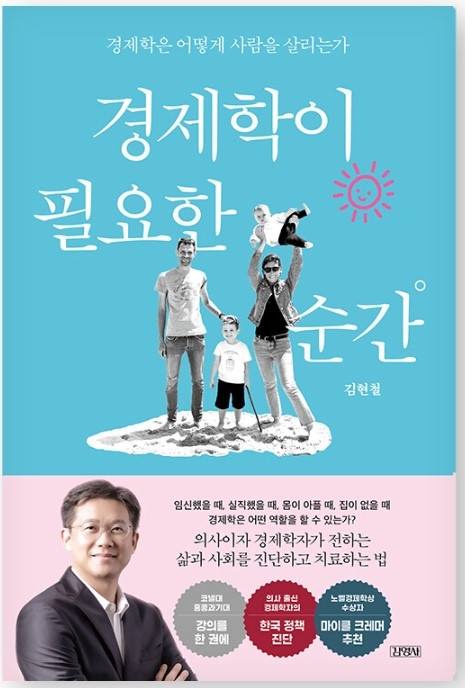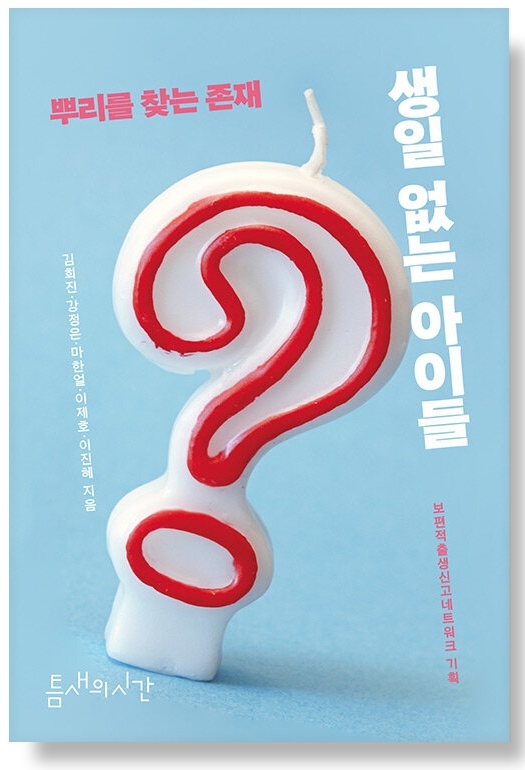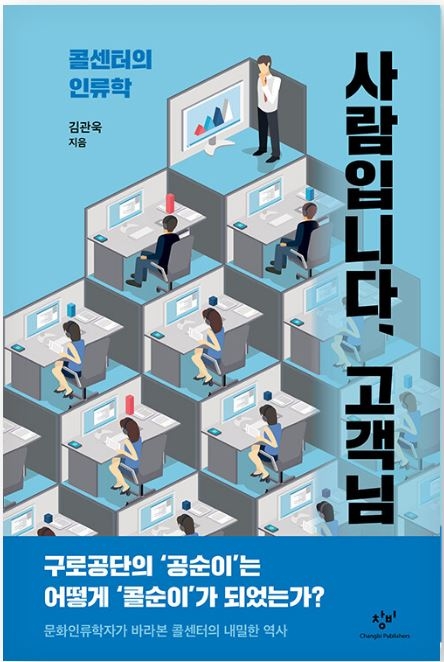파주 나눔 예술 극장 - 농사 장면이 없는 농부영화 ‘땅을 사라’
수정 : 0000-00-00 00:00:00
농사 장면이 없는 농부영화 ‘땅을 사라’
김원 조직위원장 “환경 이슈는 물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먹거리, 교육, 근로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후략)”
서울환경영화제가 개막했다. 기자는 이미 한 달 전에 ID카드를 신청했지만, 영화 보러 가는 당일 아시아 최대의 환경영화제를 압도하는 생생한 환경 이슈가 생겨 (본지 이번호 4면 ‘옥시제품 불매운동’ 참조) 이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은 없다는 마음으로 현장으로 달려가야 했다. 부득이 이번호 리뷰는 가장 보고 싶었던 영화였으나 보지 못했던 영화의 프로그램 노트로 대신한다.

▲ ‘땅을 사라’ 감독 오렐리안 리베크, 루바 빈크 Aurélien LÉVÊQUE, Luba VINK / 2016 / 다큐멘터리 / 프랑스 (사진 서울환경영화제 제공)
영화 ‘땅을 사라’는 유토피아적인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사회운동을 기록한다.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좋은 곳, 혹은 없는 곳이라는 중의적인 뜻을 가지듯 영화는 등장인물의 노력을 통해 프랑스 사회구조가 당면한 어려움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에서 땅의 공영화는 가능할 것인가?
땅과의 유대라는 의미의 ‘떼르 드 리앙(Terre de Liens)’은 소작농, 유기농가들이 높은 토지 가격 때문에 점차 땅과 격리되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농부들은 자신의 친척, 지인, 지역사회 소비자에게 투자를 받는다. 단체는 투자받은 돈으로 땅을 산다. 땅은 유기농가 및 환경주의자에게 제공된다. 자연의 산물을 돌려주는 토지의 건강성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투자처이다. 땅이 배타적 소유의 투자처가 될수록 땅값은 점점 오를 것이다. 값비싼 땅값은 농산물의 가격을 올리며 농부는 땅에서 멀어지고 소비자는 값비싼 농산물의 값을 감내해야 한다. 이 악무한의 사슬을 끊기 위한 공공재로서의 토지 개념의 확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에 역행하는 이러한 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리 없다. 그렇기에 영화는 열린 소통의 과정에 주목했다. 농사의 현장이 아니라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의 과정을 꾸준히 따라간 것은 이 때문이다.
글 정용준 기자 (프로그램 노트 서울환경영화제 www.gffis.org 제공)
#40호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