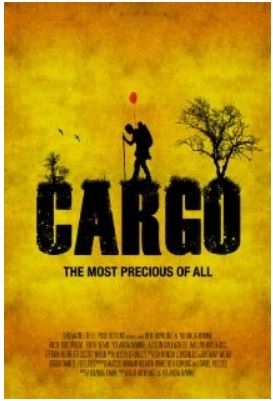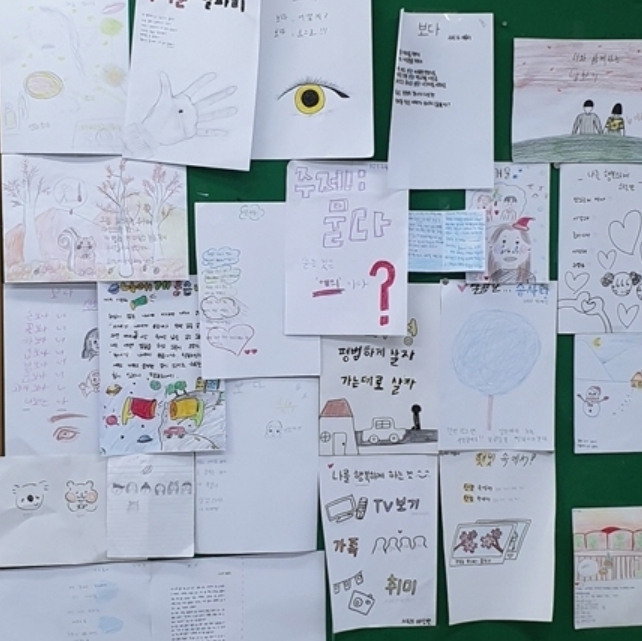흔한 고딩의 같잖은 문화 리뷰 <19> 우리 동네 고양이씨
수정 : 0000-00-00 00:00:00
아파트에서 골목 많은 빌라로 이사를 했다. 창밖 풍경이나 택배를 맡기는 곳, 난방 트는 방법 등 많은 것이 바뀌었고, 좁아진 집에 신경질이 났다. 그나마 괜찮은 변화는 골목을 걸어 다닐 때마다 고양이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였다. 피곤한 걸음으로 지나는 등굣길에도,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초저녁에도 고양이는 언제나 빼꼼 얼굴을 비치곤 금세 사라졌다. 종류도 다양했다. 노란 치즈 색 고양이, 검은 얼룩 고양이, 갈색 고등어 무늬 고양이까지 있었다. 집 안에 있으면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지막하게 울리는 건 괜찮았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면 걱정이 되어 괜히 창문 밖을 내다보기도 했다. 만져본 적도 없는 고양이들의 존재감이 날로 커져갔다.
하루는 시험공부 중에 바람을 쐬러 나온 적이 있었다. 현관 유리문 앞에 걸터앉아서 공책 한번 봤다 슬리퍼 신은 발등 한번 봤다 하는데 바로 옆 좁은 골목에서 까맣고 하얀 얼룩무늬 고양이가 나왔다. 나는 고양이가 도망갈까 봐, 고양이는 내 눈치를 보느라 서로 굳어서 눈만 마주치고 있었다. 가만히 앉아있다 눈 색이 우리 집 고양이랑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제야 내가 이 동네 고양이들을 자세히 보는 것은 처음이란 걸 깨달았다. 고양이를 좋아했지만 그 존재만 알고 있을 뿐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다.

집으로 들어가 고양이 사료를 조금 덜어왔다. 얼룩 고양이는 당연히 사라지고 없었다. 아까 고양이가 나오던 골목 앞에 사료를 쏟아놓고 조금 기다렸지만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다. 먹어주길 바란 건 아니어서 아쉽진 않았다. 그냥 앞으로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싶다는 신호였다. 아침에 나와 보자 사료는 깔끔하게 사라져 있었다.
학교를 가며 우리 동네 고양이들 생각을 했다. 핸드폰을 하면서 걷던 길을 골목 구석구석을 살피며 갔다. 쌀쌀한 아침 날씨에 거리는 한산했고 여전히 초라했지만 어쩐지 새롭게 느껴졌다. 달라진 거리를 느낄 수 있었다. 낙엽이 떨어진 길은 아침 이슬로 축축했고 갈라진 아스팔트의 금이 거미줄 같았다. 거미줄을 걷는 고양이를 생각해 봤다. 핸드폰으로 페이스 북을 들여다보며 걷는 길보다 즐거웠다.
하굣길엔 길을 건너는 고양이와 눈을 맞췄다. 다음날엔 고양이 간식을 더 샀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언니가 종종 우리 동네 고양이 사진을 찍는다는 걸 알게 됐다. 고양이들은 추운 날엔 생닭 공장 직원들이 쳐놓은 천막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왜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쉽게 알 수 있었다. 등굣길에 핸드폰을 놓기만 해도, 편의점 문 앞에 서있는 아르바이트생 언니와 괜히 어색하게 눈을 피하지만 않았어도 알 법한 일이었다.
여전히 아르바이트생 언니와는 제대로 말도 못 섞었고, 눈앞에서 내가 준 간식을 먹는 걸 본 적도 없지만 우리 동네를 살피며 걸을 줄은 알게 되었다. 아파트 단지나 상가와 조금 떨어져 있어 별이 잘 보였다. 들쑥날쑥 예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건물들 앞에는 제각기 다른 빛깔의 은은한 가로등이 있었다. 길 건너 커다란 성당의 창문은 스테인드글라스였다.
우리 동네에는 매일매일 생닭을 나르는 공장직원 씨가 있다. 갈색 염색머리의 씨유 아르바이트생 씨도 있고, 유독 맑게 보이는 별 씨나, 누렇게 빛나는 가로등 씨, 파란 배경 위에 서있는 성직자씨도 있다. 모두 초록 눈의 얼룩 고양이 씨가 알려준 우리 동네 땡땡 씨다.

조은현 「파주에서」 청소년 기자
#60호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