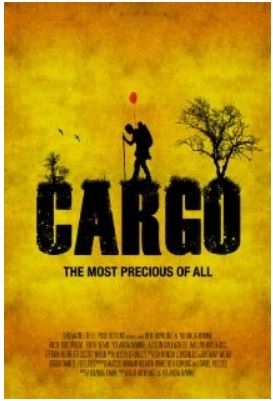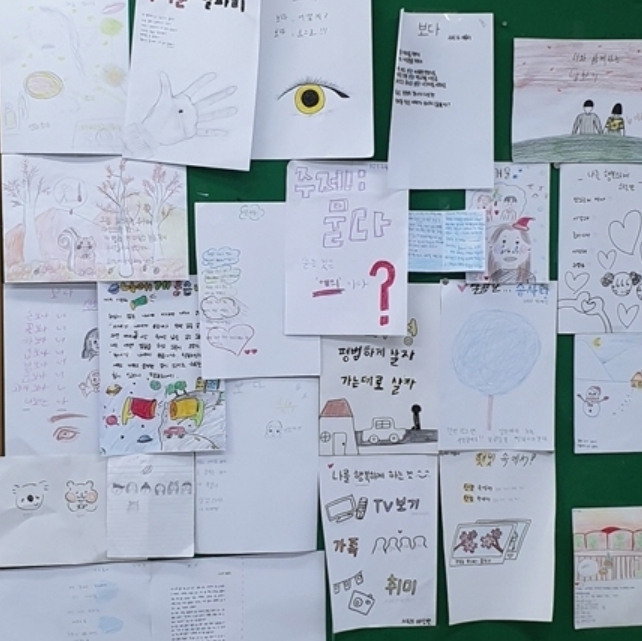19세 청춘, 어설픈 파리지엔느 되다 (7) 마지막 회
수정 : 0000-00-00 00:00:00

한국에 있다는 것이
이질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벌써 1년이 지났고 나는 얼마 전에 한국에 돌아왔다. 가족과 식사도 하고 친구들과 놀고 그리웠던 음식들도 많이 먹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끝없이 자도 계속 피곤했기 때문에 몸이 뻐근해서 못 자겠다 느낄 때까지 잠도 자 봤다.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다. 차들의 경적 소리가 시끄럽고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 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놀란다. 몸이 살짝 부딪히는 상황에서 나와 상대방 아무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게 자연스럽다.

한편으로는 모든 곳에서 한국어가 들리니 참 이상하다. 전에는 몰랐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진 각각의 말투들이 재미있다.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많이 들린다. 내가 듣고 싶지 않다고 안 들을 수가 없다.
내가 하는 말을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구속되는 느낌도 들고 내 모국어로 불편함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안정감 있기도 하다.
한국에 있다는 것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 이질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몇 번 있었다.
한번은 친구들과 밥을 먹고 계산을 하고 나오려던 때였다. 카드로 계산을 하려는데 카드 기계가 오류가 나서 우리는 2~3분 가량 기다려야 했다. 가게 주인 아저씨는 미안하다며 우리가 마신 음료수 한 병을 서비스 처리해 주셨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게를 나왔다. 이런 친절이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좋다. 그냥 대충 받으면 될 것인데 웬지 어색하다, 굳이 이런 서비스를 줘야 하는 걸까 생각도 들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싶기도 하고. 음료수 한 박스를 얼마에 들여올까 실없는 상상도 한다.
대부분 가게의 사람들이 나에게 무척 다정하게 대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따위의 인사를 더 자주 하게 된다.

얼마 전 토요일에는 광화문 광장에 갔다. 시간이 늦어 친구들과 함께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시위를 가냐고 묻더니 말한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옛말에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두 마리가 울어서 두 배로 망했어.” 그리고 어린 암탉 운운...
암탉 둘을 두고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던 걸까? 저런 종류의 혐오발언을 실제로 듣는 것은 너무나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나는 놀랐다. 음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인간들, 수십만 명을 학살한 전범국가의 수장들은 다 수탉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님 대통령이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라의 노인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똑같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오히려 그 기사 아저씨의 나이 듦을 공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과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내렸다. 그리고 내려서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얘기를 나눴다.
이러한 몇몇 상황들 안에서 난 문득 깨닫는다. 한국에 있다는 걸! 집 앞을 걸을 때, 버스를 탈 때, 집에서 쉴 때 이곳이 어떤 나라 어느 도시인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자연스러운데 저런 사건이 놓여지면 나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어딘지 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은 내게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것을 나는 왜 이상하다고 느끼는지. 이런저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가끔은 내가 내 친구들 중 한 명인 것처럼 나를 대상 취급하며 관찰하게 된다.

글을 잘못 쓴 거 같다는 느낌이 든다. 너무 어렵다. 나는 지난 1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프랑스에서 살았던 경험을 정리하는 글을 요구받았는데 돌아와서 느낀 점만 잔뜩 썼다.
애초에 시작을 잘못했지만 아무리 상상해 봐도 압축할 수가 없다.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 기억이 줄어들 것이고 그땐 글 하나로 정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 생각에 나는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변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잘 모르겠다. 내가 자주 가던 거리들은 많이 변했다. 없어진 가게도 많고 새로 생긴 가게도 많다. 가게를 없애는 사람들은 누구고 새로 내는 사람들은 누굴까. 내가 없는 동안 몇 개의 가게가 새로 태어나고 죽었을까.
그 안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들이 어느 장소나 하나의 공간처럼 느껴진다. 돌아갈 수 없는 공간. 아득한 느낌이다.
다음에 같은 장소에 다시 간대도 분명 다를 것이다. 다음은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글·사진 조은혜
#53호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