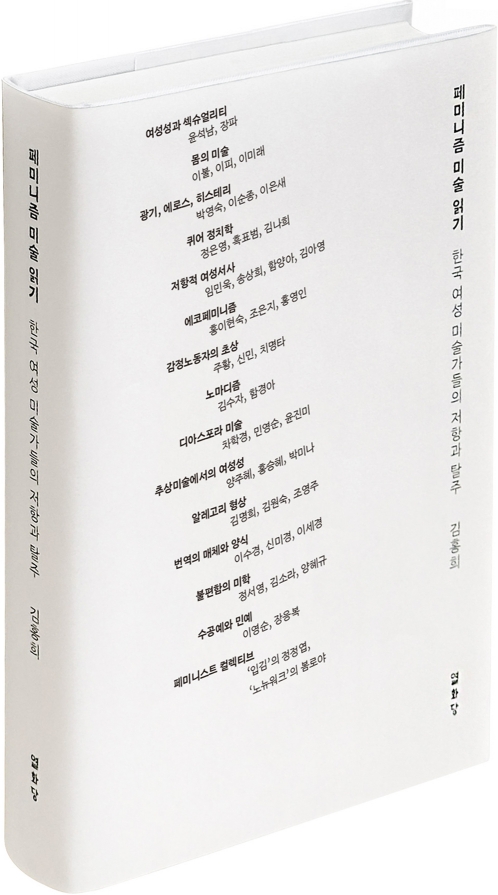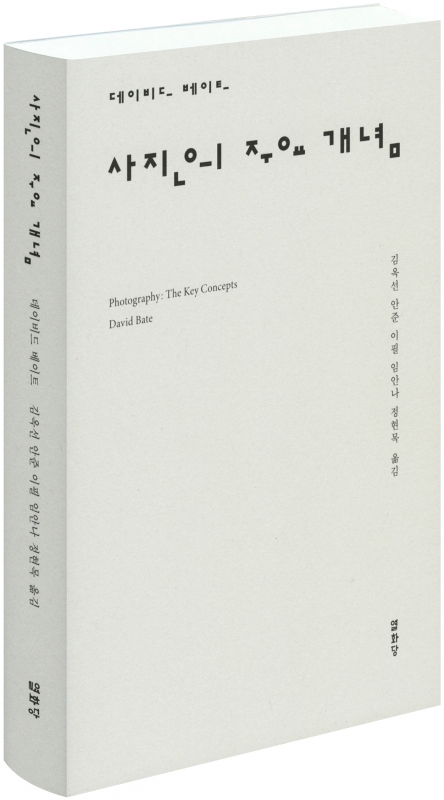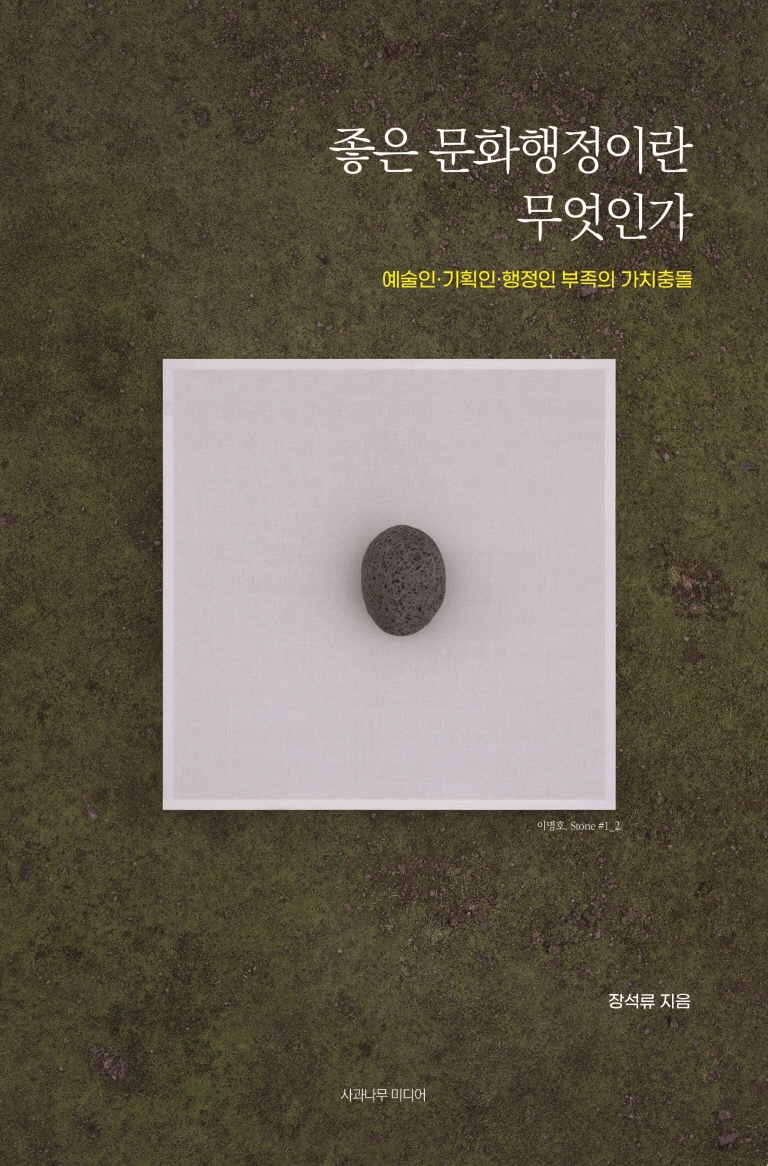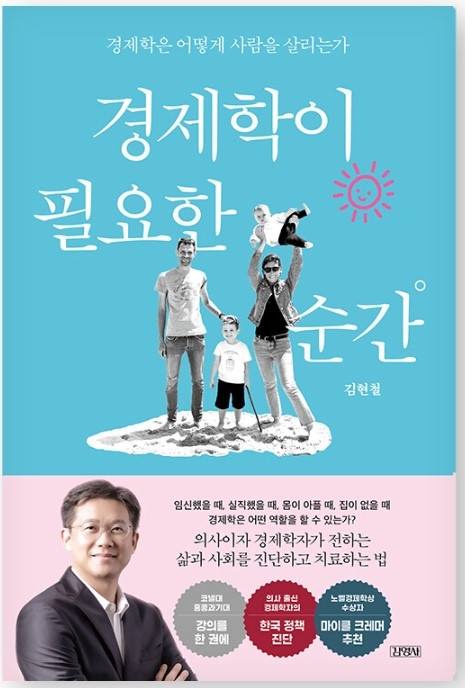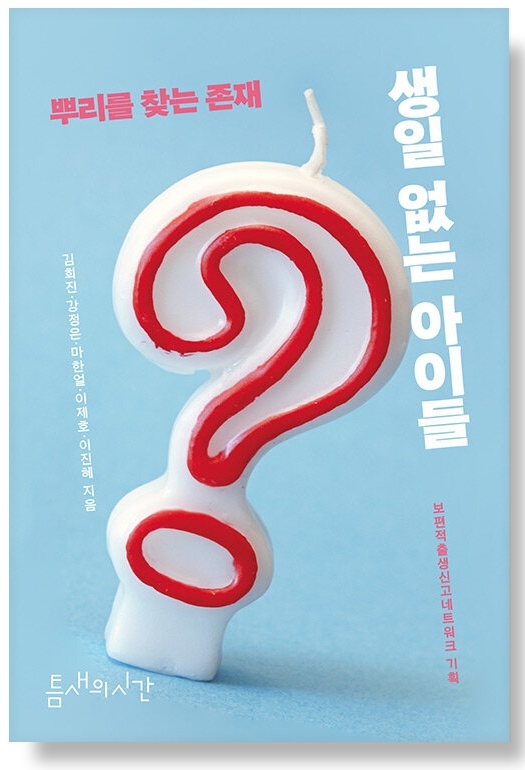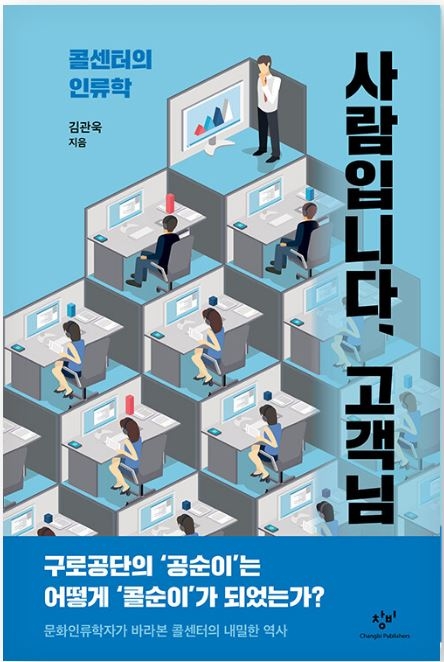[신간 책꽂이] 생을 버티게 하는 문장들
수정 : 0000-00-00 00:00:00

내가 아침에 눈을 떠 가장 먼저 하는 말은 ‘감사합니다.’이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어 언제나 감사하고 감사하다. 이 책 ‘생을 버티게 하는 문장들’을 읽고 나서는 감사함에 덧붙여 주어진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겠다는 의무감이 저절로 들었다.
문학을 시작한 이후 시집 외에는 한 눈 팔지 않았던 시인이 처음으로 산문집을 내 놓았다. 박두규 시인에 대해 아는 것은 없지만 이 책 한 권으로 시인의 삶이 어떠한지 훤히 들여다보였다.
“나의 문학이 우리 사회와 현대인의 내면에 아무런 부끄럼도 없이 자리한 탐욕을 끌어내리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살아내기 위한 마음으로 이 책을 펴낸다.”
시인이 시가 아닌 산문을 쓰게 된 이유에 마음 한 켠이 따뜻해져온다.
지리산 자락에서 살고 있는 시인은 이 책에서 자연과 사람 삶의 조화를 이야기 하고 있다. 또 남미여행에서 체득한 명상의 이로움과 인도의 부단 운동에 대해서도 들려주고 있다.
“세상을 살아내는 일의 첫 번째가 나의 존재와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일일 것이다. 저 느티나무의 작은 박새 한 마리도 알에서 깨어나 날개를 퍼덕이며 제가 날짐승인지 들짐승인지부터 가늠했을 것이고, 바람이 불면 어디로 날아야 한다는 것을 눈치 채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모든 자연의 생명은 구체적 생활세계 속에서 자기 존재와 세상을 일치시켜내는 것이 세상을 살아내는 일이었을 것이다.” (본문 204쪽)
이 책을 읽으면 난 내가 좋아하는 화가 최북을 떠올렸다. 최북의 눈보라 치는 밤에 귀가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담은 ‘풍설야귀인도’. 붓 대신 손가락이나 손톱에 먹물을 묻혀서 그리는 지두화라 표현이 좀 거칠다. 그림을 자세히 보고 있노라면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알게 된다.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 자연의 일부로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그리하여 자연 앞에 겸손함을 깨닫게 한다.
생명이 다투어 자라는 5월은 더더욱 자연의 경이로움에 숨죽이게 된다.
장경선 동화작가
#66호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