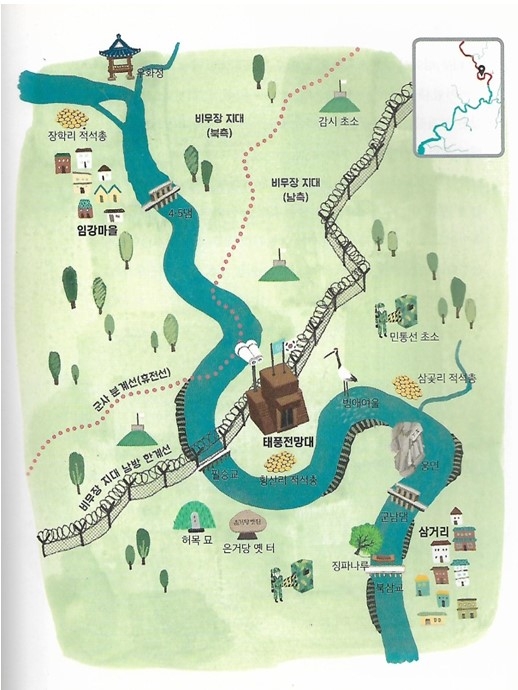사람들도 동물들도 식물들도 영원히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해타굴
수정 : 0000-00-00 00:00:00
사람들도 동물들도 식물들도 영원히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해타굴
▲ '열두달 어린 농부 학교' 에서는 발가락 사이로 흙과 물을 느끼며 그저 신난다
(옛날 해타굴의 정식 명칭은 회탁굴이다. 우리 할머니 발음을 그대로 옮겨 들었던 말이 해타굴이어서 지금은 그렇게 쓰고 적는다.)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해타굴은 내가 어릴 적 뛰어 놀던 자연 놀이터였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의 모습을 고스란히 숨겨 지켜온 공간. 그래서 해타굴엔 지금도 고라니 멧토끼 너구리 등 다양한 생명들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해타굴은 온전한 자연을 품고 있다. 어려서부터 자연에서 재미있게 놀았던 그곳 경험들은 나이 50살이 넘은 지금도 그 옛날 기억을 더듬어 어릴 적 모습으로 날 되돌려 놓기도 한다.
우리 마을 뒷동산 숲길을 지나 한참을 걷다 보면 아름드리 참나무와 물박달나무가 우거져 드리운 어둑한 나뭇가지 숲 틈바구니로 해타굴이 환한 모습을 드리운다. 해타굴은 만 여평 정도의 넓지 않은 공간이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 산 밑으로 마을이 있었고, 물이 풍부한 기름진 논과 밭이 있어 사람 살기 좋은 땅이었다. 그러나 전쟁 이후 미군부대가 진주하면서 마을은 없어지고 사람들은 그 주변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 갔다. 그 이후 60여년의 세월은 해타굴을 고립된 공간으로 남겨 놓았다. 군사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생활이 편하고 윤택해지면서 해타굴은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고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변해갔다.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고 오로지 지게와 낫과 삽으로만 농사를 지어야하는 한계가 오늘날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숨어있는 자연 공간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경운기도 들어가기 힘들어 경운기 머리만 분리해 끌고 들어가서 밭을 갈고, 가래와 삽과 괭이로 이랑을 만들어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수고로움을 나는 기꺼이 하고 있다. 밭이 정리되니, 그동안 묵혀 있던 주변 습지들이 생태교육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하였다.
▲ 해타굴의 갈대가 아름답다
특별히 손보거나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고 생생한 생태를 경험하고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그곳에 도시 아이들이 찾아와 자연과 시골 정서에 동화되기도 한다. 봄이면 습지를 채우고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가 연초록빛의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뒤이어 산벚꽃나무와 조팝나무가 하얀 꽃을 피워 해타굴은 온 세상을 환하게 봄꽃 향연을 펼친다. 꾀꼬리 뻐꾸기 파랑새가 푸른 녹음을 재촉하고 습지에선 노란 물레나물이 군락을 이뤄 여름을 노래한다.
해타굴은 물이 많다. 해타굴 위쪽 웅덩이에선 일 년 열두 달 샘이 솟고 그 물은 해타굴의 땅을 고루 적시며 흘러 내려 농사를 짓게 하고 그 안에 깃들여 사는 생명들의 생명수 역할을 했다. 아무리 가물어도 해타굴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 해타굴엔 우리만 농사를 짓는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름다운 공간을 외면할 수 없어 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땅을 일구고 곡식을 가꾼다. 물론 수확의 많은 부분은 고라니 멧돼지 두더지 꿩 까치의 몫이다. 그래도 농사는 이어진다.
지난 4년 동안 밭 아래 작은 논에선 ‘열두 달 어린이 농부학교’가 열렸다. 어린 농부들이 직접 볍씨를 뿌려 모를 키우고 모를 내고 가을이 되면 어린 농부들과 가족들이 함께 벼를 베어낸다. 해타굴은 일년에 두 번 모내기 할 때와 벼베기 할 때 주인이 자연에서 사람들로 바뀐다.
가을걷이가 끝나면 논에 물을 가두고 겨울을 준비한다. 찬바람이 해타굴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12월엔 논에 가득 담은 물이 꽁꽁 얼어붙고 그 위에서 아이들은 썰매를 타고 건강한 겨울을 보낸다. 그늘이 깊은 해타굴은 겨울 내내 눈은 켜켜이 쌓이기만 한다. 하얗게 눈 덮힌 해타굴에서 아이들과 겨울나기 동물들의 발자국 경쟁은 봄이 온 한참 뒤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
해타굴은 어제도 오늘도 꿈꾼다. 사람들도 동물들도 식물들도 영원히 함께 사는 세상을 말이다.
조영권 (파주생태교육원 원장)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