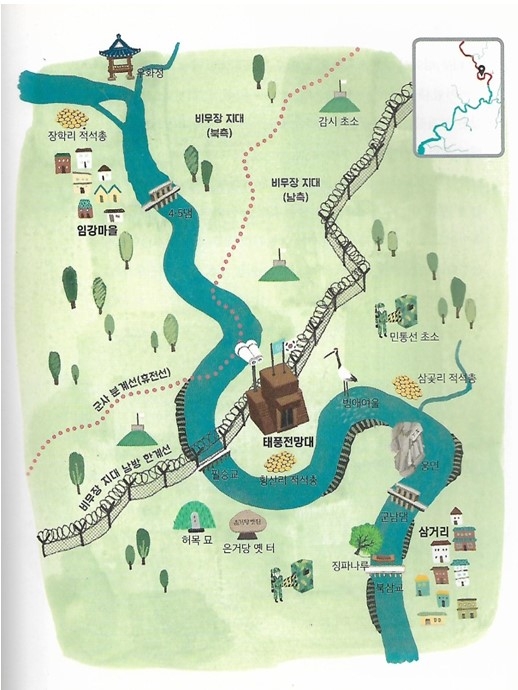임진강, 강물에 새긴 이야기 ⑤ 정처 잃은 산림처사 우계 성혼(下)
수정 : 0000-00-00 00:00:00
전란을 맞은 어떤 왕과 신하
▲파주시 파평면에 있는 파산서원.
임진년 사월 그믐, 비까지 내린 밤이었다. 왜란을 당해 왕이 서쪽으로 피란할 때였다. 왕이 임진나루에 이르러서 물었다.
“성혼의 집이 여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가리키는 곳이 멀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와 보지 않는단 말이냐?”
“이런 때를 당하여 찾아와 뵈려고 하겠습니까.”
왕은 배에 올랐다.
“근방의 목재들을 모두 불태우도록 해라.”
왜군이 뗏목을 만들어 쫓아올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승청이 타오르자 강이 밝아졌다. 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불길 너머로 힐끗 성혼의 집이라던 쪽을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해 11월, 성혼은 광해군의 분조가 있는 성천을 거쳐 의주 피란조정으로 갔다. 왕이 물었다.
“여긴 왜 왔다더냐?”
성혼은 꿇어 대죄했다. “왕께서 임진강을 건너갈 때 말고삐를 잡고서 수행하지 못하였으니, 신하의 의리가 땅을 쓴 듯이 없어졌습니다.”
왕은 의심했지만 말은 달리했다. “어렵사리 이곳에 왔으니, 참으로 가상하고 기쁘다. 의리는 회복될 것이니, 대죄하지 말라.” 그리고는 우참찬의 벼슬을 내렸다. 연달아 사직하였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말이 따뜻했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꿇어앉은 자는 왕의 눈을 볼 수 없었다.
두 해 뒤 3월, 피란 조정은 이미 서울로 돌아와 있었다. 성혼은 뒤늦게 들어와 다시 사직상소를 올렸다. 몸에 병이 깊어 왕을 모실 수 없으니 파직해 달라고 했다.
“경의 상소를 보았다. 처음 변란이 일어나 어쩔 줄 모르고 피난하게 되었는데 경의 집 앞을 지나는데도 경이 나와서 문안하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죄가 무거운 줄을 알고 죽으려 하였으나 죽지 못하였다.” 놀라 자빠질 일이었다. 왕은 자책한다고 했지만 옛일을 들추고 있지 않은가? 성혼은 더 깊이 몸을 조아렸다. “신하에게 죄가 있는데도 왕께서 자책한다 하셨으니 신은 당장 죽어 없어지더라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나라일이 여기에 이르렀다. 눈물이 흘러내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사직하지 말라.” 얼마나 지극한 말인가. 성혼은 황망히 시골로 돌아갔다. 왕은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벽에 몇 글자를 갈겨썼다. ‘대의를 무너뜨리고 왕을 현혹시키는 자는 누구인가!’ 붓끝이 떨렸지만 왕의 표정은 볼 수 없었다. 벽을 향해 돌아서있었기 때문이다.
성혼이 초야에 묻힌 뒤의 일이다. 조정은 국란 중에 물러난 재신들의 죄를 묻기로 했다. 명단이 왕에게 올라왔다. 성혼이 있었다. 왕은 명단에서 성혼을 지웠다.
“이 자는 불러올릴 것도 없다.”
그리고 죽어 땅속에 묻힌 뒤의 일이다. 조정은 이러저러한 죄를 털어내 성혼의 관작 삭탈을 요청한다. “공론대로 하라. 다만 이런저런 죄를 물을 것 없다. 임금을 저버린 죄 하나면 된다.” 왕은 편안했다. 표정을 감출 일도 사라졌다. 그는 어느덧 국란을 이겨낸 왕이 되었고 책임은 다른 곳에 있었다.
왕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며 신하를 압박한다. 정치에 닳고 닳은 왕, 선조에게 시골선비는 상대도 되지 못한다. 신하는 자세를 낮추고 처분을 기다릴 뿐이다. 시골에 은거한 학자에게 정치는 처음부터 없었다. 의리대로 처신하면 그뿐이었다. 성혼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왕과 신하의 문답은 평행선을 긋는다. 서로 자기 갈 길을 갈 뿐이다. 성혼을 위한 변명은 사후에 후학들이 한다.
도망한 자는 남아 있는 자에게 왜 이토록 가혹했을까? 이 장면은 한국전쟁에서도 되풀이 된다. ‘비겁한 권력은 백성에게 용감하다.’고 말하면 될까?
글 · 사진 이재석 DMZ생태평화학교 교장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