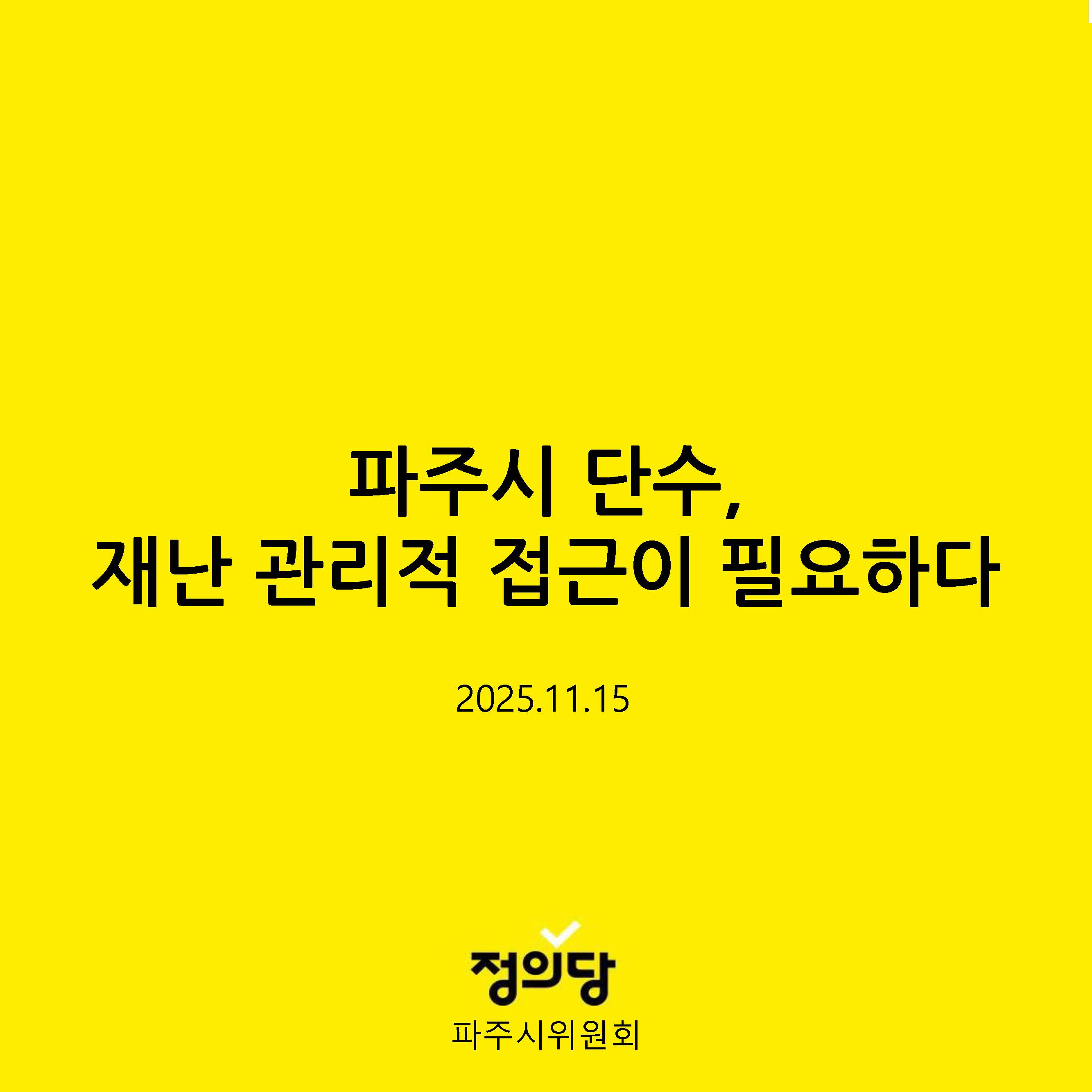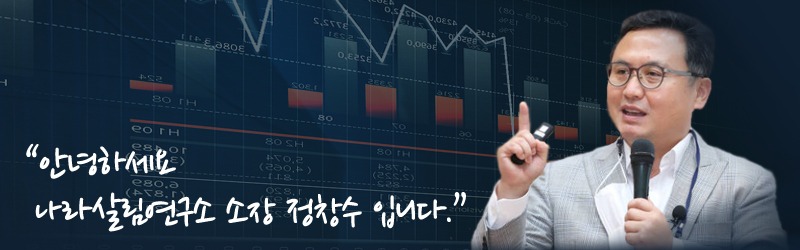윤장열의 미디어칼럼(20) 아이들의 손에서 스마트기기를 빼앗아야 하는가?
윤장열의 미디어칼럼(20) 아이들의 손에서 스마트기기를 빼앗아야 하는가?
윤장열(언론학자)
독일의 16세 이하 학생에게 휴대폰을 금지하는 모습(ai 제작)
최근 독일의 여러 주(州)들은 새 학기부터 학교 내 휴대폰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브레멘 시는 아예 초등학교부터 10학년까지 휴대폰을 보이지 않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른 주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규제 정책의 목적은 분명하다. 집중력 향상, 사회적 기술의 회복, 그리고 아이들을 디지털 과부하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한 금지가 만능은 아니라고 말한다. 독일의 심리학자 카타리나 샤이터 교수는 “스마트폰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일 수 있다”며,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서로 어울리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금지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일방적 조치 역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논쟁은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 EU 집행위원장은 “흡연이나 음주에 연령 제한이 있듯, 소셜미디어에도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미성년자의 SNS 사용 금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실제로 호주는 세계 최초로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반한 플랫폼에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틱톡을 “청소년 심리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악의 SNS”로 규정하며 강력 규제를 촉구했다. 단순히 기기를 교실에서 치우는 문제를 넘어, 디지털 환경 자체가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논쟁을 한국에 그대로 던져본다. 한국 사회는 어느덧 ‘디지털 강국’이라는 수식어를 즐겨 쓴다. 정부와 기업은 앞다투어 AI 교육, 코딩 교육, 콘텐츠 제작 툴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빠져 있는 것 같다.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스마트기기가 아이들을 오히려 스마트하지 않게 하는 건 아닐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더 잘 활용하기”와 “더 많이 생산하기”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이는 아이들을 플랫폼 경쟁에 더 깊이 끌어들이는 일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내는 중독적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거리를 두고 선택할 힘을 기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청소년 우울증, 사이버 괴롭힘, 혐오와 차별적 콘텐츠 노출, 그리고 주의력 결핍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기술 기업의 알고리즘이 아이들의 시간을 ‘상품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이다. 학교와 사회가 여기에 맞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단순히 영상을 잘 만드는 법이 아니라, 언제 기기를 내려놓고 친구와 대화할지를 선택하는 힘이다.
독일과 유럽의 사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단순히 “쓰지 못하게 하자”는 접근과 “더 잘 쓰게 하자”는 접근 사이에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후자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기술과 인간 사이의 균형이다. 아이들이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앱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적절한 절제와 사회적 관계를 지켜주는 안전망이다. SNS를 둘러싼 세계적 규제 논의는 우리 사회가 이제야 던져야 할 근본적 질문을 보여준다.
#미디어칼럼 #윤장열 #스마트기기 #리터러시교육 #독일 #휴대폰금지 #16세이하 #디지털강국 #호주 #소셜미디어